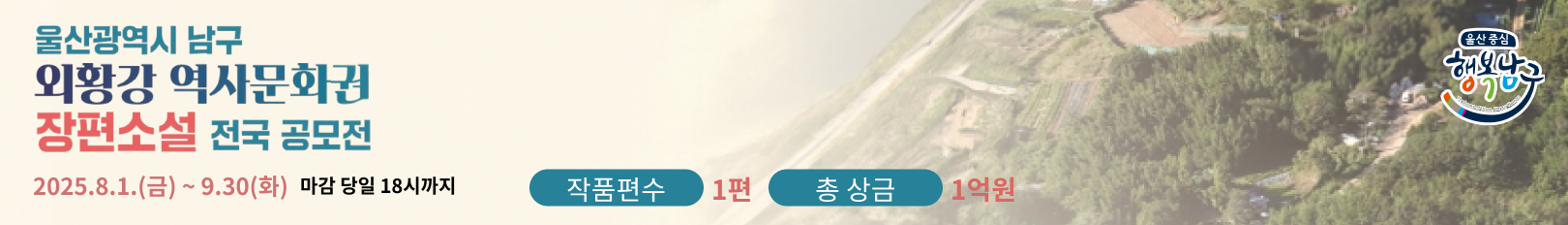월간문학
월간문학 2025년 9월 679호
3
0
6월로 접어들자 산천초목이 온통 녹색으로 수놓으니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여행은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예정에 없이 갑자기 떠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해서 순천 송광사의 템플스테이를 바로 예약했다. 그곳을 선택한 것은 법정 스님이 생전에 거주하셨던 불일암을 찾아 스님의 향수를 다시금 되새겨 보고 싶었다.
수필집 『보석을 찾는 마음』에 수록된 글 중 「법정 스님의 입적을 기리며」가 있다. 그분의 삶을 존경하고 스님께서 남기신 주옥같은 글들은 삶의 자양분이 되고 지혜의 밭이 되어 준다.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기까지 자신의 내면의 절제된 행동이 뒤따라야 하고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삼가기를 환기시켜 준다.
지인 부부도 시간이 허락되어 함께 길을 나섰다. 강원도에서 순천까지 꽤 먼 거리지만 가슴이 설렌다. 오전 7시에 집을 나서 송광사에 도착하니 오후 1시였다. 주암호를 끼고 산문에 들어서니 커다란 현판에 ‘승보종찰 송광사 불일문’이 위엄 있게 우리를 맞이한다. 배정받은 방은 깨끗하고 방 앞문과 뒤 툇마루 문을 마주 보게 열어 놓으니 계곡물 소리와 서늘한 바람이 한데 어우러져 시원하고 상쾌하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자 4시에 경내를 안내하는 스님께서 오셨다. 인상이 서글서글하고 선한 이미지의 영향력으로 마음이 포근하다. 스님의 해설을 들으며 경내를 둘러보는데 곳곳에 ‘묵언’이라는 글씨가 붙어 있다.
송광사는 신라 말 혜린 선사에 의해 창건되었으며 당시 절 이름을 ‘길상사’라 하였다. 이후 폐사 직전에 이른 절을 1200년 전 보조국사가 고려 불교를 쇄신하고자 일으킨 정혜결사 운동의 중창불사로 대규모의 수도 도량으로 발전했으며, 진각, 태고, 환암, 무학 등 16명의 국사를 배출한 승보사찰이기도 하다.
송광사는 우리나라의 3대 사찰로 불교에서는 부처님(佛), 가르침(法), 승가(僧) 이 세 가지를 삼보(三寶)라고 하는데, 불자는 이 세 가지의 보배를 귀히 여기고 귀의해야 한다. 삼보사찰로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는 양산의 통도사(佛)를 불보사찰(佛寶寺刹), 부처님의 가르침인 팔만대장경이 있는 합천의 해인사(法)가 법보사찰(法寶寺刹), 한국 불교의 승맥(僧脈)을 잇고 있는 순천의 송광사(僧)가 승보사찰(僧寶寺刹)이다.
송광사는 조계총림으로 선원, 승가대학, 율원, 염불원을 갖추고 방장의 지도하에 정진하는 종합 수행 도량을 말한다. 대한불교조계종에는 현재 7개의 총림 송광사·해인사·통도사·수덕사·동화사·쌍계사·범어사 등이 있다.
일주문 안으로 들어서니 보조국사가 송광사에 와서 꽂아 놓았다는 향나무 지팡이가 보조 스님이 입적하고 나서 그대로 말라버려 ‘고향수’라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보조 스님이 송광사에 환생해 오면 다시 푸른 잎이 핀다고 하였으나 800년 동안 고목의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다.
우화각을 지나 사천왕문을 통과해 종고루 아래로 진입하니 대웅보전 앞마당이 나온다. 대웅보전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삼세불과 지장, 보현, 문수, 관세음보살이 나란히 모셔져 있다. 송광사에는 석등과 석탑이 없고 절에 가면 흔히 들을 수 있는 풍경 소리도 없다.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가 스님들의 공부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석탑과 석등은 송광사 터가 연화부수로(물 위에 연꽃이 떠 있는 듯한 모습) 무거운 탑을 세우면 가라앉는다는 풍수설 때문이라고 한다.
스님과는 저녁 차담 시간에 뵙기로 하고 공양간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공양간에 들어서니 입구서부터 ‘묵언’이라는 글씨가 조용한 분위기와 맞물려 사람들이 많은데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을 발우에 먹을 만큼의 밥과 반찬을 담아 창가 쪽 식탁에 앉았다. 공양하는 내내 묵언으로 숟가락 소리만 무슨 기계음처럼 들렸다.
저녁 예불이 끝나고 처소로 가는 길에 지인과 대화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한 보살님이 다가와 묵언을 하라며 주의를 준다. 절에서의 규칙을 익히 알고 있는 터라 부끄러웠다. 같이 간 지인은 이를 무시하며 자꾸 말을 걸어와 입장이 곤란했다.
‘묵언 수행’은 불교에서 말을 하지 않는 참선을 말한다. 말을 함으로써 짓는 죄업을 짓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함이다. 꼭 필요한 말은 해야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을 열라고 한다.
은퇴하고 나니 자연스럽게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과 어울리게 된다. 어쩌면 하나같이 말들을 그렇게 잘할까. 인생 말년에 모든 에너지가 입으로 모이는지 지갑들은 닫고 입만 서로 앞다퉈 연다. 온갖 자랑에 잘난 척에 남의 말이 전부인 것을.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불편하다. 어쩌다 모임에서 말을 많이 하고 돌아올 때는 공허감을 느낀다. 차라리 침묵할 것을 하고 후회하게 된다.
법정 스님은 입 다물고 귀 기울이는 습관을 익히라고 한다.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침묵은 자신의 내면의 뜰을 가꾸는 것이다.
스님과의 차담 시간은 각자의 고민을 상담해 주는 자리이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집착이라고 한다. 이 세상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사랑하는 사람도, 건강도, 가족도 영원할 거라 믿지만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무상(無常)을 알면 변화하는 삶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다음 날 오전 3시에 일어나 새벽 예불에 참석했다. 고요한 산사의 정적을 깨트린 것은 법고의 북치는 소리였다. 법고의 시작으로 범종과 목어, 운판의 소리가 끝나자 법당 안의 사부대중의 염불 소리가 시방세계로 퍼져 나간다.
아침 공양을 마치고 무소유 길을 걸었다. 길을 걷는 동안 혼자이고 싶어 일행과 거리를 두었다. 울창한 숲길을 걸으며 법정 스님을 생각했다. 불일암에 도착하니 스님이 계셨던 처소는 닫혀 있고 그 앞에 방명록이 있어 그리움을 담아 몇 글자 남기고 내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