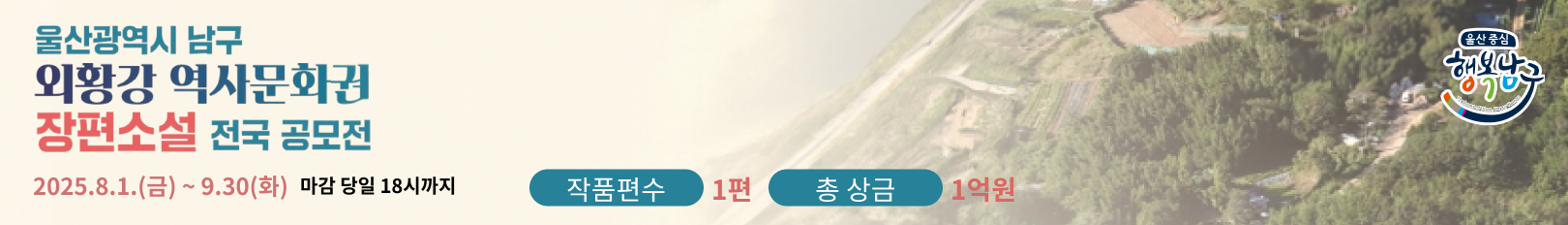월간문학
월간문학 2025년 7월 677호
63
0
제주도는 신혼여행으로 처음 갔었다. 육지에서는 느낄 수 없는 남국의 정서, 이국적 풍광에 사로잡혀 신혼의 단꿈을 꾸었던 섬이다. 그 이후로 여러 번 다녀왔지만, 관광지를 돌고 올레길을 걷거나 해안도로 따라 드라이브하거나 유명한 카페 나들이하는 것으로 시간을 소일하곤 했다. 언제나 아름다운 경치 속에 좋은 것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겼다. 이번 여행에서 여태껏 알던 그 제주도가 나에게 다른 얼굴로 다가왔다.
JDC 도민 상생 지원 사업으로 서귀포 문인협회에서 초청한 전국의 문인들과 함께하는 여행이었다. 서로 일면식도 없지만, 문학을 한다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제주를 함께 느낄 수 있다는 생각에 가기 전부터 기대가 크고 설렜다. 진짜 제주의 이야기를 들을 좋은 기회가 될 것만 같았다.
제주에 사는 문인들과 함께 서귀포 근방을 다니며 해설을 듣고 현장 답사를 했다. 지난번 제주에 왔을 때 일정에 쫓겨 못 갔던 기당 미술관 관람은 의미가 깊었다. 제주를 오롯이 사랑해서 내는 변시지 화가의 노란색 광채가 내 마음속에 빛으로 들어왔다. 특히 말로만 들었던 4·3 사건의 실제 장소를 와보고서야 나는 새로운 제주의 역사와 맞닥뜨렸다. 이름조차 생소한 알뜨르 비행장과 ‘백조일손 지묘’ 추모 공원은 충격이었다. 아랫녘의 너른 들판이라는 알뜨르는 입속에서 굴러가는 상큼한 소리와는 반대로 아픈 과거를 지니고 있다.
알뜨르 비행장 주차장에 내리자 너른 들녘이 우리를 맞았다. 북쪽으로는 멋진 산방산이 기개도 당당히 서 있고 남쪽으로는 푸른 바다가 출렁였다. 밭에는 노랗게 핀 갯무꽃이 하늘거리고 봄볕은 따사로웠다. 검붉은 황토를 뒤집으며 농민들은 제주 무 수확에 바빴다. 길 저편에 서 있는 트럭에는 무 자루들이 가득 실려 있다. 한없이 평화로운 풍경이 그곳에 있었다. 밀레의 그림같이 따사로운 들녘 저 멀리 밭 한가운데 아가리를 쩍 벌리고 있는 시설물이 눈에 들어왔다. ‘창고인가? 창고를 지으려면 밭 가장자리 한쪽에 지어 놓던지’ 알고 보니 격납고였다. 비행기를 집어넣는 격납고. 아니 들판에 웬 비행기 격납고가?
1926년 일제강점기, 중국 침략을 준비하는 전진 기지로 일본은 제주를 선택했다. 감자와 마늘이 자라는 평화로운 농경지를 비행기가 날아가는 활주로로 바꾸었다. 아까 보았던 격납고는 일본에서 날아온 전투기에 주유하거나, 중국 침략을 위한 비행기들이 쉬어가는 곳이었다. 이곳에서 가미가제 특공대 훈련도 하였다고 한다. 여유롭고 평화롭던 들녘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순간에 전쟁의 한복판으로 들어섰다. 비행장을 건설하려는 물자와 노동력까지도 착취당했다. 남의 나라 전쟁에 동원되었던 제주도민들의 땀방울이 내 마음에 맺힌다. 그 시간과 공간 속의 바람이 나를 꿰뚫고 지나간다. 명치끝에서 목울대까지 알지 못하는 분노가 울컥울컥 올라온다.
알뜨르 비행장 옆 섯알오름에 오른다. 고사포 진지가 잡초를 덮어쓰고 앉아 있다. 둥근 구덩이 가운데로 둘레에는 사람이 드나들 만한 구멍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미군 비행기를 격추하려고 공중을 향한 포가 360도 회전하는데 어느 곳에 서든지 폭탄을 제일 빠른 경로로 공급하기 위해 만든 구멍이었다고 한다. 고사포 유적지 주변에 제멋대로 자라고 있는 들풀이 그때의 피폐했던 제주도민의 생활을 엿보게 했다. 찌릿한 전기가 온몸을 훑고 지나간다. 서늘한 바람이 그때의 이야기를 해 줄 듯 불어오는데 나는 여태 이런 비극을 모르고 여기 온 것이 죄스럽기만 했다. 파도가 저리도 요동치고 푸른 멍을 달고 사는 것이 이런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었나 보다.
가슴에 푸른 멍을 안고 내려오니 ‘예비 검속 섯알오름 유적지’라 새겨진 돌 이정표가 보인다. 그 길을 따라 삼백여 미터 걸어가면 예비 검속 희생자 추모비가 나온다. 섬에서 보기 드물게 넓은 평야 지대여서 뭇 사람들의 시기 질투가 많아서였을까? 일제의 수탈에 이어 이번에는 같은 민족에게 학살당하는 비극의 현장이 되었다. 한국전쟁 당시 군경은 ‘예비 검속’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동조한 사람들을 색출해 내었는데 이 과정에서 지식인 또는 무고한 양민들까지 불순분자로 분류되어 처형되었다. 예비 검속이란 죄명으로 끌려온 부녀자, 아이들, 도민들은 영문도 모르고 총에 맞아 죽었다. 혹시라도 찾아오는 이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며 고무신이며 옷가지를 하나씩 벗어 던졌다고 한다. 추모비 제단에는 떡과 과일이 차려져 있고 그 밑에 검정 고무신이 주인을 기다리며 나란히 전시되어 있다.
‘백조일손 묘’ 조상들이 한날한시에 죽어 뼈가 엉기어서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 한 자손이라는 묘지석이 내 가슴에 턱 얹힌다. 추모비 뒤에 있는 학살의 현장을 걷는다. 이유도 모른 채 끌려온 아기 엄마, 만삭의 새댁, 아버지 손 잡고 따라온 소년, 노부모와 처자식을 두고 온 가장들은 울리는 총성에 물웅덩이로 고꾸라졌다. 갑자기 총성이 들리고 내 심장을 맞힌다. 덜 아문 상처에 소금이 닿은 것 같은 아픔이 온몸을 통과한다. 제주의 역사를 하나도 몰랐다는 부끄러움에 급히 숨을 곳을 찾는다.
“언니 뭐 해, 어서 와.”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본다. 이름 모를 하얀 꽃이 피어 있다. 그들의 혼인가. 시간은 무심히 흐르고 자연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데 이제야 여기 서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 제주는 풍경이 아름다운 관광지로만 알았다. 오늘에서야 겨우 4·3 사건의 한 단면과 ‘백조일손’의 슬픔을 만나 나의 무지함을 깨닫는다. 제주가 아름다울수록 제주를 할퀸 상처가 깊다는 것을 떠올린다.
들녘의 식물들이 그들만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제주는 제주만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무언의 바람이 나의 등을 토닥이며 스치고 지나간다. 무 수확을 마친 들녘에는 어느새 감자 싹이 검붉은 흙을 뚫고 나와 초록 얼굴을 내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