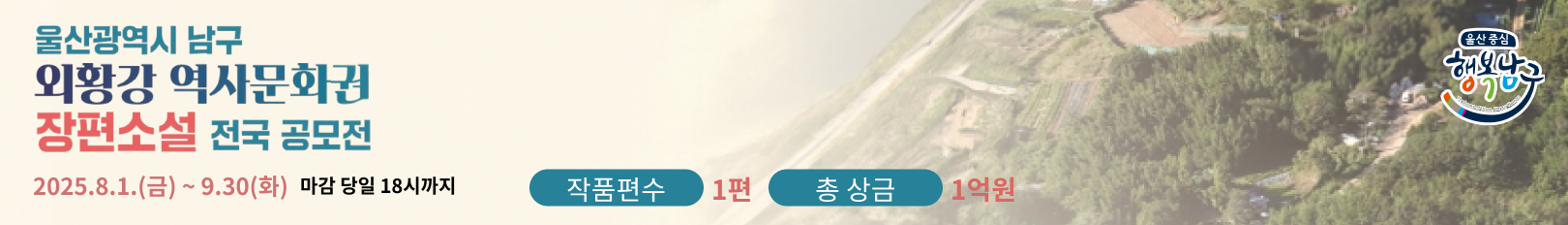월간문학
월간문학 2025년 7월 677호
62
0
새벽바람이 아직은 차다. 흙바닥으로 내려앉은 바람 끝으로 느껴지는 청량함이 좋아서 새벽잠의 유혹에도 집 밖으로 나서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오롯이 혼자 걷고 싶어 길들여진 습관이다.
아침 고요의 가운데서 여린 바람이 실어 나르는 것은 비단 꽃향기뿐만이 아니다. 바짝 말라 더 이상 생명은 사라지고 소멸이라고 생각되었던 마른 나뭇가지 끝에서 연둣빛 잎이 열리고 묵묵히 꽃잎이 피고 지는 것을 바람이 알려준다.
지난밤 비로 앓아누웠을 꽃잎들이 궁금해져서 오늘 산책길은 익숙하게 걷던 방향을 벗어나 걸었다. 평소 자주 걷던 공원이나 운동장이 아니라 집 근처에 있는 초안산 자락을 향해 걸었다. 숲속 오솔길의 한적함을 누리며 바닥에 피어난 작은 들꽃들을 바라보다 잠시 고개를 들어보니 다정하게 걷는 노부부의 뒷모습이 시야에 들어온다. 숲이 내어주는 바스락 소리를 들으며 느릿한 걸음으로 나란히 걷는 그 모습에 잠시 걸음을 멈추게 되었다.
연초에 사랑하는 사람이 먼 길을 떠났다. 20대에 만나 50대가 넘도록 오랜 시간을 근거리에서 말없이 곁을 내어주며 따듯하게 지켜주셨던 시아버님과의 이별이었다. 가족으로 인연을 맺은 30여 년 동안 같은 울타리 안에서 슬픔과 기쁨의 시간을 공유하던 지난 일들이 여린 바람을 타고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천성적으로 수줍음이 많으셨던 아버님과는 사실 진지한 대화는 많이 나누지 못했지만 언제나 애정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던 순간순간의 그 시간들이 귀하고 감사하다.
발 빠르게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아쉬움과 죄송한 마음이 가득하지만, 그런 그리움과 아쉬운 감정은 그대로 내 안으로 잘 스미게 두고 이제는 좋은 기억으로만 간직하고 싶다.
단 며칠간의 짧은 병원 생활 후 아버님이 90세 인생 소풍을 잘 마치고 먼 길을 떠나시던 날은 맹추위가 기승을 부렸다. 당신이 뿌리내린 자녀라는 줄기에서 열매 맺은 손주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아버님을 기억했다. 비슷한 경험이 여러 번 있었어도 여전히 어색하고 낯선 장례 절차를 진행하며 그분이 살아오신 삶의 속도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아버님의 부재가 소멸이 아닌 어쩌면 자연으로의 회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온순하셨던 당신의 성품대로 조용히 사시다가 홀연히 떠나신 아버님이 그립지만 아직도 부재를 느낄 수가 없다. 그저 잠시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가신 듯하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 해맑은 미소를 안고 현관 안으로 들어설 것만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 따뜻함이 실린 그 온화한 미소와 선한 눈빛이 그립지만 상실감은 크지 않다.
초안산 입구 오솔길 끝에는 주인처럼 서서 활짝 핀 벚꽃이 숲길을 밝히고 있다. 겨우내 헐벗었던 나목에서 적당한 때가 되면 이렇게 새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저 자연의 힘이 경이롭다. 그러니 사실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아주 떠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버님의 소천은 소멸이라는 단어 안으로 세상의 인연은 넘겨주고 저 꽃향기와 바람과 구름 그리고 손주의 미소로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큰 물줄기인 아버님의 유연한 궤적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열매를 맺으며 서로를 보살피며 사는 중이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고 살면서 그렇게 얻은 열매가 다시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새순을 내며 가지로 뻗어나가는 일은 자연의 순환과 비슷하다.
초안산 정상으로 오르는 산책길이 다시 조용하다. 부지런히 오가던 사람들의 흔적이 사라지고 난 후 낡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면 뭔가 충만해진다. 조금 안일해진 일상과 타성에서 벗어나려고 나름 애쓰는 일이 내게는 새벽 산책인데 눈 돌리는 곳곳마다 연초록이 두런거리며 기지개를 켜는 소리로 평화로움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나 홀로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어수선한 시국이나 일상의 소란 속에서 건조해진 나를 채우는 것이 혼자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홀로 선다는 것은 자기 안으로 더욱 풍부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가끔 외로운 시간으로 들어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사실 그 외로움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무디어지고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홀로 자연 안에 머물다 보면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말처럼 “만약 산책에 동반자를 찾는다면 나는 자연과 하나가 되어 교감하는 어떤 내밀함을 포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에 공감하게 된다. 그 말은 인생의 산책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는 잠시 비워진 시간이 필요하고 그 홀로 됨 속에서 점차 안으로 풍부해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삶을 조명하고 받쳐주는 것이 죽음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생을 마감하며 돌아올 수 없는 긴 산책길을 떠나게 되면 그제야 그가 살아온 그 걸음을 되짚어보게 되는 것 같다. 나 역시 그랬다. 오랜 시간 곁을 내어주시던 아버님의 존재를 크게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다. 익숙한 일상으로 이미 친숙해져서 그 존재감보다는 아버님이 먼 길을 떠난 후에야 그림자처럼 조용히 제 자리를 지키던 큰 울타리의 무게감이 느껴진다.
모든 것을 비워야 다시 충만해진다는 그 말을 체감하는 요즘이다. 살면서 너무 오랫동안 과거의 기억에만 머물러 있다면 현재의 일상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없다. 빠르게 달려가는 시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주지 않기에 우리 스스로 마른 나뭇가지 끝에서 움트고 있는 담녹색을 찾아야 하고, 부드럽게 살랑이며 볼을 스치는 청량한 바람이 일상 속으로 걸어 들어오도록 애써야 한다. 오늘도 가볍게 인생을 산책하며 계절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