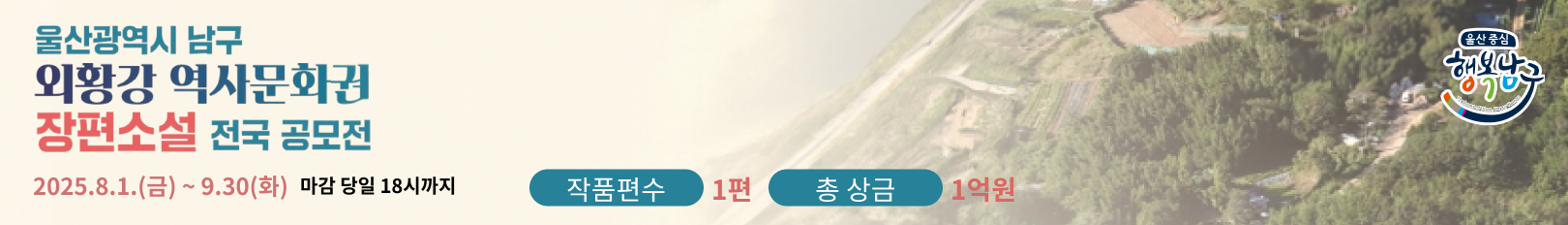월간문학
월간문학 2025년 5월 675호
82
0
한동안 잊고 지냈던 과거 유명 가수가 아침 방송에 얼굴을 비춘다. 싱어송라이터이자 듀엣 ‘해바라기’의 이주호, 이광준이 통기타를 가슴에 안고 살아왔던 이야기와 감미로운 선율을 들려주기에 작업실 출근을 잠시 멈추고는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동시대를 살아왔던 터라 감회가 남다르다. 두 번째 곡으로 <내 마음의 보석상자>를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린다. 예상치 못한 과거 여러 슬픈 상황의 장면들이 오버랩되며 눈물샘이 터져 버린 것이다. 아내에게 혹여 들킬까 봐 슬그머니 도망치듯 나만의 공간으로 내려왔다.
“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알고 있었지 서로를 가슴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햇빛에 타는 향기는 그리 오래 가지 않기에∼ 더 높게 빛나는 꿈을 사랑했었지∼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영혼 속에서 음∼ 음.”
도입부부터 적당히 경쾌한 리듬으로 시작해 클라이맥스로 가는 중간 부분까지다. 분명히 사랑을 노래한 가사임에도 왜 내게는 사랑하고 거리가 먼 배를 곪던 아픈 기억으로만 연결이 되는지 의아하기도 하고 스스로 원망스럽기까지 하다. 문득 나는 ‘내 마음의 보석 상자’를 어디에 두고 여태껏 살았을까 곱씹어 보게 된다. 내가 볼 땐 내 마음의 보석 같은 상자는 돈과 귀금속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아마도 가족을 포함하여 다양한 루트로 발산되는 유한, 무한의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소중한 것을 담아 간직하며 살 수 있다면, 진정 보석보다 더 값진 것을 나의 마음속에 지니고 매일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 내면의 영혼을 무한한 사랑으로 살고 있는 그야말로 값진 인생이 아닐까 싶다.
중학교 1학년 시절, 몇 년을 전후해 유난히 배가 고파 허덕이던 때가 있었는데, 그땐 돌이라도 씹어 먹을 정도로 식욕이 엄청나던 시기였다. 형편이 어렵던 작은아버지 집에 얹혀 살며 겨우 학교를 다닐 때라 끼니를 제때 챙겨 먹는 것도 힘들었기에 밥 한 번 배불리 먹어 보는 게 소원이다시피 했던 그런 시절이었다. 어느 날인가 친척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단칸방에 함께 살며 밥도 챙겨 주시고 한 번씩 도시락도 싸 주셨는데, 아마도 새벽부터 장사를 나가시는 작은아버지의 부탁이 있었지 않았나 싶다. 보리쌀이 적당히 섞인 밥과 그 밥 옆으로는 반찬통 없이 김치가 반찬으로 어우러진 첫 도시락을 싸 가던 날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환희, 그 자체였다. 문제는 그 도시락을 점심시간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쉬는 시간도 아닌, 둘째 수업 시간에 도저히 그 유혹을 넘기지 못하고 까먹고 말았다. 그 정도로 배가 고팠던 것이다. 도시락 뚜껑을 여니 김치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칠판 앞에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께서는 분명히 인지하셨음에도 애써 모른 척하는 기색이 역력해 보인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밥을 먹을수록 안쪽으로는 모두가 흰쌀밥이 아니던가. 이는, 친척 어르신이 학교에서 기죽지 말라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시골에서 올라와 얹혀사는 내가 불쌍하기도 했고, 밥을 제공해 주는 식구들의 눈치도 적당히 봐야 했으니 그리하셨을 것이다. 그 작은 도시락 바닥, 어찌 보면 보석상자 같은 그 공간에 흰쌀밥을 푸며 위로는 보리쌀이 섞인 밥을 얹으셨을 그 상황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진다.
그 시절, 겨울이 가까워지자 학교 정문에서 가까운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허름한 포장마차 천막이 보이며 풀빵(국화빵)을 파시는 할아버지가 등장하셨다. 아마도 해마다 이맘때면 그 자리에 나타나셨나 보다. 돈이 없던 나는 그냥 냄새만 맡으며 늘 지나치곤 했는데, 가끔은 용돈 몇 푼이 있던 친구들 틈에 끼어 한두 개씩 얻어먹기도 하면서 그 할아버지와 안면을 트게 됐다. 여러 정황상 내가 지독히도 가난한 집의 아이라는 사실을 그 어르신도 아셨을 것이다. 가끔은 혼자 풀빵 굽는 것을 물끄러미 한참이나 쳐다보고 가곤 했었으니까. 빵이 구워지는 검정색 틀 아래로 연탄불이 있고 풀빵이 구워지면 할아버지는 솜털 같은 방망이에 기름을 발라 가며 열심히 그 검정 틀을 요리조리 닦고 계시던 현란한 손길이 눈에 선하다. 마치 그 모습은 귀한 보석을 소중히 다루듯 애지중지하는 특별한 풍경이기도 했다. 아니 어쩌면 그 틀을 비롯한 반죽을 부어내는 주전자, 팥소를 뜨는 도구 등 모든 것들이 그 할아버지에겐 보석상자의 보석들보다도 더 귀한 존재였을 것이다.
세월은 흘러, 그 시절에 56년을 훌쩍 뛰어넘어 만 70세가 되는 해로 접어들었다. 얼마 전 귀국해 위층에 사는 두 손녀딸이 이제 5학년과 3학년이 된다. 다 함께 아침과 저녁을 자주 하는 편이고 가끔은 외식도 하는데, 잘 먹기도 하지만 복스럽게 먹는 모습을 쳐다보자니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다. 세종시에 사는 두 외손자를 보러 가거나 올라왔을 때도 마찬가지다. 네 명의 손자, 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금쪽같은 시간이다. 손자 두 녀석도 어느새 4학년과 2학년이 되어 내가 아버지를 저세상으로 보냈던 1학년 시절을 넘겼음에도 지금의 나로서는 할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어 너무 기쁘고 무엇보다도 언제라도 배불리 먹일 수 있다는 현실이기에 행복하다. 글씨(서예) 또는 글(수필)을 쓰고 가끔 전시를 하는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할 줄 아는 소중한, 아니 보석보다도 더 귀한 내 새끼들이다. 네 손주 녀석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내 마음속 보석상자’ 안에서 영원히 오래도록 함께할 보배 같은 존재들이다.
오늘따라 날씨가 꽤나 춥다. 천막 속 풀빵을 굽던 할아버지의 모습과 구수한 냄새가 무척이나 그립고 <내 마음의 보석상자> 선율과 잘 어우러지는 오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