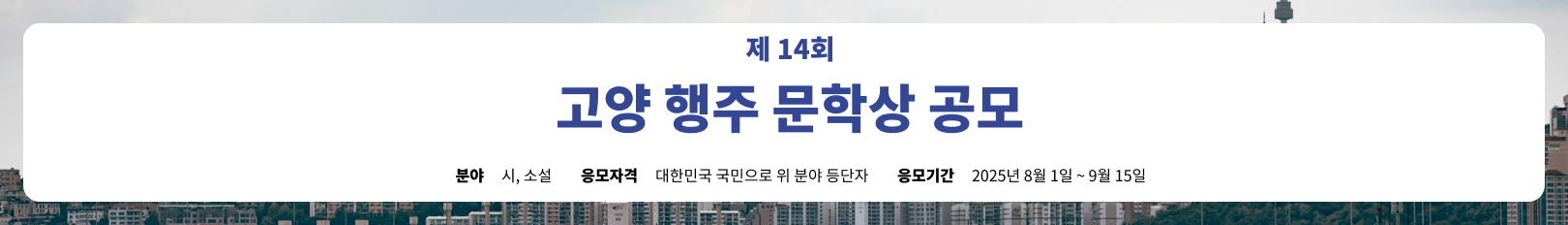월간문학
월간문학 2025년 5월 675호
68
0
호텔을 나서면서 옷깃부터 여몄다. 4박 5일 여정의 중턱. 낮밤을 잊은 비바람으로 인해 역사적 명소를 따라가는 여정은 스산하고 고단했다. 11월 둘째 주의 중국 시안(西安) 여행을 두고 나름 괜찮은 선택이라 믿었는데.
냉기 서린 비바람에 우산을 폈다 접었다 하며 1, 2, 3호갱으로 구성된 병마용갱을 관람하기 위해 ‘진시황병마용박물관’의 정문을 통과했다. 북적이는 인파, 구불구불한 장사진, 간밤에 들은 그대로였다. 심호흡으로 각오를 다진 후 장사진에 합류했다. 관광 가이드의 제안을 받아들여 관람 동선을 1호갱–3호갱–2호갱 순으로 정했다.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1호갱의 내부로 발을 들였으나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 겹겹이 앞을 막고 선 사람들과 막무가내로 등을 미는 사람들 틈에 끼여 후텁지근한 체증을 꽤 오래 견뎌야 했다. 까치발을 하고 두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카메라 셔터를 눌러 보았지만 남은 것은 앞사람의 뒷머리뿐이었다. 걷다 서다를 거듭한 후에야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도용(陶俑)들을 마주할 수 있었다. 3호갱과 2호갱도 마찬가지였다.
복원의 손길을 거친 실물 크기의 인물 도용들은 진시황이 자신의 능묘를 지킬 목적으로 만든 지하 군대의 구성원들인 셈이다. 단정한 머리 모양과 결의에 찬 눈매, 각기 다른 생김생김과 표정, 흐트러짐 없는 옷매무새…. 그리고 금방이라도 속도를 높일 것 같은 전차와 말 등. 단계별 제작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적·육체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을까.
발굴 당시에는 색채를 띤 도용들이 대다수였다는데, 아쉽게도 우리 일행이 대면한 도용들은 색채의 흔적이 사라진 채였다. 발굴 지식 부족과 보존 기술 부족이 주원인이리라. 1호갱과 달리 2, 3호갱의 경우에는 발굴에 속도를 내지 않는다고 한다.
병마용갱은 1974년 우물을 파던 농부들에 의해 세상에 나왔다. 50여 년 전의 우연한 발견은 발굴 조사 과정을 거치면서 2000여 년의 역사적 가치로 다시 태어났다. 하루 관람객 수를 제한해야 할 만큼 역사 문화 유적지로서 주목을 받아 온 병마용갱은 어느새 중국인들의 자부심이 되었다. 불원천리 선인들의 궤적을 좇는 중국인들의 열정에 공주에서의 오래지 않은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어린 티를 갓 벗은 학생들이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백제 고분인 무령왕릉을 답사하던 장면이다.
병마용갱으로부터 1.5km 떨어져 있는 진시황릉은 먼 발치에서 일별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진시황릉이라는 표지석이 없었다면 동네 야산이나 구릉 정도로 착각할 만큼 평범했다. 통일된 중국에서 강력한 권력을 누리던 진시황은 자신의 미래 세계인 능묘 건설에 엄청난 시간과 노동력을 동원했다고 한다. 불로장생을 꿈꾸었던 진시황은 살아생전의 막강한 권력이 미래 세계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간절했을 것이다. 진시황릉은 현재의 발굴 기술로는 온전하게 발굴하기 어려운데다 발굴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하여 미발굴 상태로 두었다. 향후 50년 동안에도 여전히 발굴 계획이 없다고 한다. 아마도 역사 문화 유적지로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 없이 미래 세대의 몫으로 남겨 두려는 의도이리라.
4박 5일 여정의 말미. 귀국길에 오르기 전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시안셴양공항에서 멀지 않은 ‘한양릉지하박물관’을 방문했다. 한양릉의 주인은 한경제, 장건을 통해 실크로드 개척사를 완성한 한무제의 아버지라고 한다. 박물관 직원들이 나누어 주는 비닐 덧버선을 챙겨 신고 은은한 전등빛을 따라 들어가 도용들을 대면했다.
한양릉의 도용들은 진시황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다. 신장과 체격, 얼굴 표정과 분위기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차이. 한눈에 보기에도 한양릉의 도용들은 실물 대비 3분의 1 크기로 제작되어 신장과 체격이 작았다. 머리와 몸통과 다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기다란 막대처럼 보이는 인물 도용들만 눈에 띄었다. 평소에 눈썰미가 좋다는 말을 자주 듣는 사람이지만 두 팔을 지닌 도용들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았다. 관람객의 동선을 안내하는 직원에게 도용들의 팔에 대해서 물었다. 처음에는 막대 모양의 틀에서 대량으로 찍어 낸 몸통에다 나무로 만든 두 팔을 끼우고 옷까지 만들어 입혔다는 설명이다. 그랬던 것이 세월을 버티지 못한 팔과 옷이 삭아 없어지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변했다고 한다.
오염 방지용 비닐 버선, 외부 접촉을 막는 유리벽과 덮개, 쾌적한 실내 환경 등, 한양릉의 도용들은 원형 그대로를 보존하려는 노력과 수고의 결과일 것이다. 중국 최대의 지하박물관이라는 찬사가 아깝지 않은 이유다.
크기를 줄이고 제작 과정을 단순화한 것은 백성들의 삶을 우선시하는 권력자의 철학이라고 이해해도 될는지. 한나라의 황제들은 진나라 흥망의 역사를 간과하지 않았던가 보다. 만리장성이나 진시황릉 같은 대규모 공사가 백성들의 저항을 불러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비를 몰고 다니던 여정은 몇 조각의 생각할 거리를 안겨 주었다. 머릿속을 맴도는 역사적 명소와 관련 인물들의 삶, 그들의 공과(功過), 그들이 꿈꾸던 미래를 살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오늘은 훗날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
머잖아 역사의 한 점으로 남을 2024년의 끝자락. 최첨단이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은 전자제품들, 우주 개발에 대한 노력과 열정, 인공지능(AI)이 함께하는 일상…. 미래 세대들은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궁금증보다는 책임감이 앞서는 오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