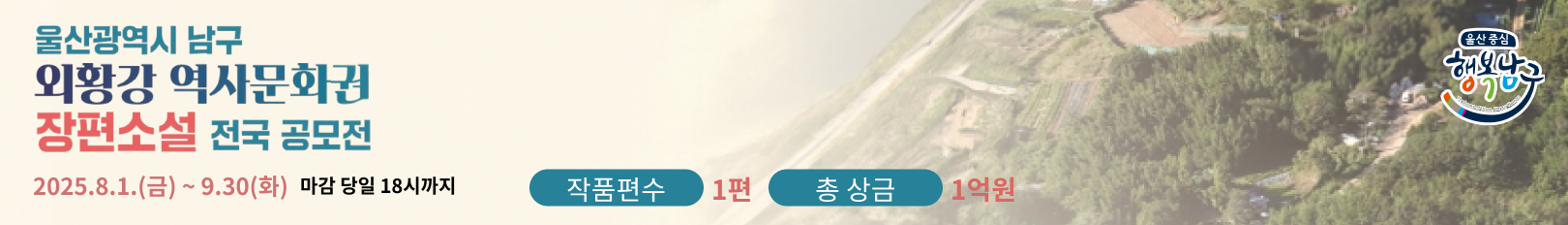월간문학
월간문학 2025년 5월 675호
34
0
겨우내 웅크리고 떨며
몰래 울었던 긴 밤
두려움의 시간 잊었는가
한 겹 두 겹 벗어던지고
아무렇지 않은 듯 녹아
봄이 부르는 이슬 되어
촉촉이 스며든 숨결은
자유를 기다리고 있었나
외로움을 말아먹은 채
보듬어 줄 수 없는 모퉁이
버려진 삶이라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지
얇은 입술 파르르 떨며
무뎌진 가슴 일으켜
바람 부는 강변 걸어오는
봄 손님 맞으려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