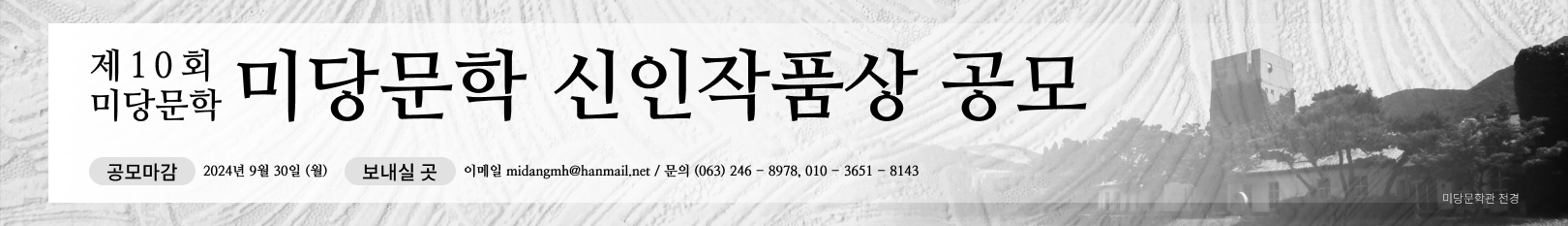월간문학
월간문학 2025년 2월 672호
82
0
하얀 목련이 하늘 춤을 추는 날, 아버지가 집을 나와 아카시아 향기 섞인 새벽공기를 마시며 신평정유소에 갔다. 서울 가는 직행 버스를 타고 용산 시외버스터미널에 와서 다시 완행버스로 갈아타고 강화에 도착했을 때 해가 서쪽 하늘에 기울어 있었다.
그때 나는 집 안마당에서 아기와 놀고 있었다. 반쯤 열린 철 대문 사이로 한 노인이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순간 아버지라는 느낌이 들어 급히 뛰어나갔다.
“집 찾기 어렵구먼.”
주소 쪽지를 들고 고삿골목을 헤맨 끝에 가까스로 내 사는 집을 찾았단다. 세 들어 사는 처지에 문패가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아버지 오셨어요? 왜 미리 연락을 하시지 그랬어요? 마중 나갔으면 집 찾느라 고생하지 않으셨을 텐데요….”
“애기가 보고 싶어 갑자기 왔어.”
“잘 오셨어요.”
“어디 보자, 내 손녀딸∼”하면서 유모차에서 번쩍 들어 안는다.
“참, 예쁘기도 하구나.”
해설피에 아버지와 목욕탕에 갔다. 읍내에서 물 좋다고 소문난 때문인지 손님들이 바글바글하다. 아버지와 나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앉아 서로 등을 밀어 주었다. 오래 전 고향 집에서 등멱을 한 이후 처음으로 함께 하는 목욕일지 싶다.
옛 추억이 떠오른다. 학창 시절 여름 방학엔 늘 농사일을 도왔다. 고추며 콩 고구마 따위의 밭을 돌아가며 김매고 비료 주고 물을 주었다. 되돌아서면 풀밭이란 말이 있듯이 밭엔 작물보다 잡풀이 더 빨리 자랐다. 그 시절 우리 집은 여름 내내 풀과 씨름하였다.
한나절 밭에서 일하다가 점심때가 되면 안마당 우물가로 달려간다. 나는 땀에 젖은 베적삼을 벗어 던지고 고무다라에 펌프 지하수를 퍼올린다. 그리고는 엉덩이를 높이 세우고 엎드리면, 아버지가 박 바가지로 찬물을 푹 퍼서 등에 쫙 끼얹는다. 온몸이 쪼그라드는 듯하였다. 아버지가 등을 밀면 옆구리와 가슴까지 밀어 주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몸을 뒤틀며 간지럽다고 소리를 지르지만, 아버지는 몸통 구석구석을 밀면서 “가만히 있으라”고만 할 뿐이었다. 아버지 차례가 되면 나는 복수하듯 허리춤까지 찬물을 마구 끼얹었다. 그러면 그럴수록 아버지는 “어∼ 시원하다”고 하면서 좋아하셨다.
그날 목욕탕에서 나이든 아버지의 벗은 몸을 처음 봤다. 너무 앙상했다. 젊은 시절 통통하던 살은 어디 가고, 뼈만 만져지고 손등은 소나무 버걱이다.
‘나를 낳아 기르느라 이 지경이 됐구나.’
옛날 아버지가 내 등을 아무 말 없이 밀었던 것처럼, 나는 아버지 등을 말없이 밀기만 하였다.
“얘야, 살살 밀어라. 아프구나.”
“예∼.”
“아버지, 개운하시지요?”
“그래, 평생 이렇게 개운하게 목욕하기는 처음이구나.”
순간, 아버지의 기울어진 어깨를 보았다. 자세히 보니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뚜렷하게 낮았다.
짙게 타오르는 저녁노을을 등지고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나는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발걸음만큼이나 무겁게 닫힌 입을 열었다.
“어깨가 왜 기우셨어요?”
아버지가 한 숨을 쉬면서 말했다.
“젊었을 때 시골 5일장이 설 때마다 거리지름장사1)를 했다. 큰 짐자전거에 무거운 곡물을 싣고 언덕길을 오를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밀고 가는데, 이때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도록 오른쪽 어깨에 짐을 받쳐야 한다. 바둥거리는 돼지를 실었을 때는 힘이 두 배로 더 든다고 한다. 이런 일을 여러 해 하다 보니 어느새 어깨가 기울어졌더구나. 그 망객산2) 고개, 얼마나 높고 길었던지….”
서해대교를 놓기 전, 고향에 가려면 아산만을 건너 삽교천 방조제를 지나 망객산 고갯길을 넘었다.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아버지가 거리지름장사 하던 시절 힘들게 짐자전거를 밀고 가는 모습이 떠오르곤 하였다.
망객산 넘어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고갯길을 넘어야 신평장을 볼 수 있었다. 내가 초등학교 다니던 1960년대만 해도 버스와 같은 교통편이 없어 시골 사람들이 장보러 가려면 곡식을 등에 지거나 머리에 이고 가야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 망객산이 어찌 신평에만 있으랴. 지구가 울퉁불퉁한데 곳곳이 망객산이고, 가는 길마다 높은 언덕길이었으리라. 아버지는 지구와 우주의 접점에서 지구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삶의 자전거를 밀었을 것이다.
우리 교회 앞 언덕길이 아버지의 어깨와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얼핏 보면 꼭대기의 예배당을 향하여 올라가는 보통 가파른 언덕길이지만, 멀리서 보면 왼쪽으로 기울었고 교회에서 내려다보면 오른쪽으로 기울었다.
가파른 언덕길을 걸어 올라갈 때마다 힘들게 망객산 고갯길을 오르는 아버지가 보인다. 아버지는 온몸에 땀이 비오듯하고 어깨가 기울도록 힘들지라도, 언덕 위에 올라서면 자전거가 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내리막길이 있다.
1) 5일장이 열리는 시장에 농산물을 판매하러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물건을 사서 시장의 대상(大商)에게 팔아 이문을 남기는 일.
2) 충남 당진시 신평면 소재의 산.